이 기사를 공유합니다

'위작'(僞作)과 '대작'(代作)! 현재 미술계를 요약하는 단어다. 특히나 대작이라는 생소한 말이 조영남이란 유명인과 관련돼 많은 이들의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다. 최근 '선생님도 대작하세요?'라는 말을 듣고는 자괴감이 들었다는 모 작가의 푸념도 들었다.
위작이란 진짜와 비슷하게 만든 작품이고, 대작은 남에게 시켜서 작품을 만든 것으로, 간단히 말하자면 그렇다. 하지만 이 문제가 그리 간단히 정의될 일이 아니다.
600년 전 르네상스 시대에 신흥 부자들에게 팔려는 의도로 그리스 로마시대의 작품이 만들어졌다. '미켈란젤로'도 그리스의 조각을 모방해서 팔았다는, 그러니까 가짜를 판 기록이 있다. 진귀한 물건을 수집하는 취미역사가 긴 중국에서는 2,000년 전 당나라 때부터 가짜 물건을 팔았다. 심지어 그 당시 위작을 만드는 비법을 기록한 책도 나올 정도였다고 한다.
미술역사만큼 위작과 대작을 쉽게 정의내릴 수 없다. 고려해야 할 사항이 긴 역사만큼이나 많은 것이다. 또 자신이 제작했음을 알리는 즉, 작품에 이름을 쓰는 것도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다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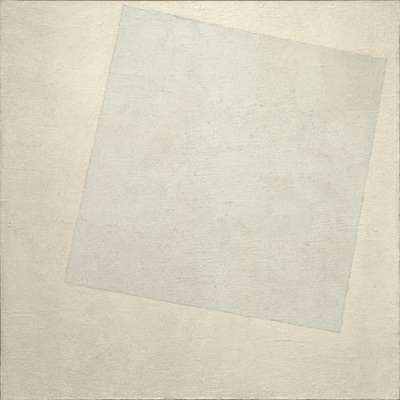
누가 만들었나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은 상품으로서 미술작품을 완전히 이해했을 때부터 생긴 일이다. 불과 200여년 전부터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지면서 이름이 중요하게 되었다. 이렇게 복잡한 역사를 가진 문제를 법이나 혹은 몇 가지 사례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우리사회의 '예술 사랑도'가 낮다.
어쩌면 오랫동안 '천경자'의 미인도, '이우환'의 위작 문제와 '조영남'의 대작 스캔들을 명쾌하게 재단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. 이런 현상이 일어난 구조를 혹은 우리의 인식을 오히려 점검해야 한다. 예술은 세속을 벗어나 장대한 자연풍경이나 선녀같은 미녀를 예찬하는 것이라는 고리타분한 관념이 존재하는 한 말이다. 예술만은 지고지순하게 순정을 지켜야 한다는 강요에 대한 정당성을 의심해야 한다.
예술도 우리 일상에 한 자리를 차지하는 보통일이지 별나라 일이 아니다. 예술이 유별난 이들의 부자놀음이거나 예술가네, 작가네하는 젠체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. 예술을 빌미로 순진한 척, 고상한 척, 특별한 척하지 말라는 것이다. 예술도 다 즐겁게 살자고 하는 일이고, 속되게 말하면, 돈 벌자고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.

